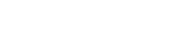2025. 10. 17. 13:53ㆍthink
인스타그램은 왜 점점 쓰레기장이 되고있나: 오프라인과 진실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1. 관음의 즐거움에서 자극의 경매장으로
남의 일기장과 앨범을 훔쳐보는 관음의 즐거움이었던 때.
2010년대 초반, 인스타그램을 여는 순간은 작은 설렘이었습니다. 친구가 먹은 점심, 주말에 간 카페, 반려동물의 일상이 정사각형 프레임 안에 담겨 있었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사진도 있었고, 어색한 셀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진짜 사람의, 진짜 하루였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듯한 관음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때마다 작은 도파민이 분비됐죠. 스탠포드 대학 연구는 이를 '가변적 보상(Variable Reward)'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새로운 게시물은 슬롯머신처럼 우리를 중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중독은 건강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삶'이었고, 그 삶은 우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비교는 있었지만 공감도 있었고, 부러움은 있었지만 친밀감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상이 사라지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기업들이 인스타그램의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피드는 점점 더 광고로 채워졌습니다. 정교하게 디자인된 이미지, 전문가가 촬영한 영상, 세련된 카피가 일상의 사진들 사이를 밀어냈죠.
2016년, 인스타그램은 시간순 피드를 폐기하고 '관련성' 기반 알고리즘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관련성의 핵심 지표는 '참여(Engagement)'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가 많은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었죠. 브랜드들은 이를 역설계해 '참여를 만드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려 할 때
2020년대 초반,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일상을 '콘텐츠'로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게시하기 전에 멈춥니다. '이 사진이 충분히 좋아요를 받을까?' '이 각도가 가장 잘 나왔나?' 일상의 기록은 퍼포먼스가 되었고, 관음의 대상이었던 일기장은 관객을 의식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Kyle Chayka가 'Posting Ennui(게시 권태)'를 명명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친구의 점심 사진이 뜨던 피드는 수익성에 집착한 알고리즘의 게임판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6월 Morning Consult 조사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약 3분의 1이 전년보다 게시를 줄였다고 답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AI의 범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
2023년, 결정타가 왔습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대중화였죠. ChatGPT와 Midjourney의 등장은 콘텐츠 생산의 문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누구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진 공간이 됩니다. 저 사진은 실제로 여행 가서 찍은 건가, 아니면 AI가 만든 건가?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심은 피로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데 드는 인지적 비용이 콘텐츠를 보는 즐거움을 초과했죠.
만화가게가 된 플랫폼
초기 인스타그램이 친구의 일기장이었다면, 지금의 인스타그램은 온갖 자극적인 만화책만 빽빽이 진열된 가게입니다. 각 콘텐츠는 더 강렬한 색감, 더 자극적인 제목, 더 과장된 썸네일로 시선을 끌려 경쟁합니다.
2025년 상반기 인스타그램 평균 참여율이 전년 대비 24.1% 하락해 0.45%에 머문 것은 이 딜레마의 결과입니다. 브랜드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화려한 콘텐츠를 만들지만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쟁하는 무대 자체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2. 쓰레기장에서는 브랜드가 죽는다
거대한 예산, 증발하는 신뢰
2025년 세계 광고 시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70%가 넘는 금액이 디지털 채널로 흘러갔죠. 그러나 이 거대한 예산이 쌓이는 곳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공간입니다.
에델만이 2025년 초에 발표한 글로벌 신뢰도 조사는 역설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기업'이었지만, '미디어'는 많은 나라에서 불신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미디어의 일부였죠.
사람들은 기업 자체는 신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 말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진실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극의 경매: 참여하면 브랜드가 죽고, 참여 안 하면 묻힌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자극의 경매장'입니다. 브랜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경매에 참여하면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는 훼손됩니다. 100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가 틱톡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죠.
반대로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알고리즘은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를 배제합니다. 깊이 있는 제품 설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진정성 있는 고객 스토리는 한 번의 스크롤에 묻힙니다.
크리에이터 의존의 함정
많은 기업들이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은 크리에이터 마케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린 신뢰입니다. 크리에이터의 팔로워는 브랜드의 자산이 아닙니다. 협업이 끝나면 관계도 끝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크리에이터 콘텐츠 자체도 '만화가게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협찬이고, 대가를 받고 하는 말이며,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크 소셜의 역설
공개 광장이 쓰레기장이 되자, 사람들은 사적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친구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링크를 공유하거나, 네이버 카페 같은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브랜드는 역설에 빠집니다. 진짜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ROI를 증명할 수 없고, ROI를 증명할 수 없으면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오프라인은 아직 일기장이다
매장은 조작할 수 없다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의심받을 때, 오프라인은 여전히 진실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서 제품을 집어드는 순간, 그것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마감 상태를 손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게를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제품 품질 개선은 마케팅 투자와 달리 명확한 성과를 냅니다. 불량률이 줄어들면 반품률이 떨어지고, 고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내구성이 향상되면 재구매율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지표는 직접 측정 가능하며, 매출과 직결됩니다.

경험은 기억되지만, 광고는 잊혀진다
친구와의 저녁 식사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요즘 쓰는 노트북 진짜 좋아.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가." 회사 점심시간 잡담에서 동료가 추천합니다. "그 브랜드 운동화, 6개월 신었는데 아직도 멀쩡해."
이런 입소문은 공개 피드에 올라가지 않아도 퍼집니다. 오히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신뢰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협찬이 아니고, AI가 생성한 것도 아니며,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밖에서 만나자
Kyle Chayka가 관찰한 'Posting Zero'의 종착점은 단순히 게시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 자체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만나자." 이 제안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에서 100개의 게시물을 스크롤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습니다. 주말에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 제품을 직접 만져보는 것이 온라인에서 수십 개의 리뷰를 읽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한국 시장의 독특한 기회
한국은 2025년 초 기준 인구 대비 소셜 미디어 보급률이 95%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오프라인의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같은 플랫폼에서 경쟁하니 차별화는 어려워지고, 광고 단가는 올라갑니다.
반면 오프라인 경험은 희소합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한국에서, 물리적 접근성은 곧 경쟁 우위입니다. 서울 강남에 매장 하나를 열면, 천만 명이 1시간 내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프라인 경험이 온라인 확산의 강력한 촉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매장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면 즉시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후기를 남깁니다. 브랜드가 '공유 적합성'을 설계하지 않아도, 경험 자체가 공유를 유도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친구의 일기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광고가 범람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콘텐츠로 가공하기 시작했으며, AI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일기장은 만화가게가 되었고, 다시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기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하루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친구의 근황을 알고 싶어하고, 좋은 제품을 발견하면 추천하고 싶어합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 광장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대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오프라인 만남에서 합니다.
브랜드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쓰레기장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브랜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신뢰하는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오프라인입니다.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만지는 경험, 직원과 나누는 진실한 대화, 눈으로 확인하는 제품의 마감 품질. 이 모든 것은 AI가 생성할 수 없고, 알고리즘이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은 여전히 '일기장'입니다. 진실이 살아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오프라인 경험은 다시 온라인으로 확산됩니다. 매장에서 감동받은 고객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 진짜 좋더라, 너도 가봐." 이 확산은 공개 피드에 올라가지 않아도 강력합니다. 아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브랜드의 선택
브랜드는 선택해야 합니다. 쓰레기장에서 계속 소리를 지를 것인가, 아니면 일기장을 다시 만들 것인가. 알고리즘의 자비를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고객의 신뢰를 직접 쌓을 것인가.
인스타그램은 변했습니다. 고객도 변했고, 신뢰의 지형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경험, 진짜 제품, 진짜 관계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프라인에 있습니다.
일기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브랜드가 해야 할 일은 그 일기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객이 있는 곳, 신뢰가 형성되는 곳, 진실이 증명되는 곳으로. 바로 오프라인이라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새로운 공간으로.
일기장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
'thin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구, 보수라는 안온함이 만든 느린 도시의 경제학 (0) | 2025.09.01 |
|---|---|
| 일본 문학, 왜 한국독자에게 특별하게 읽히는가 (0) | 2025.08.30 |
|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 超時空要塞マクロス (0) |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