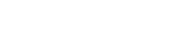2025. 8. 30. 22:48ㆍthink
서점 신간 코너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름이 걸리면, 나는 여전히 무심히 손을 뻗는다. 그 순간 옆자리의 누군가도 같은 동작을 한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일본문학은 우리 독서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 표지에 멈추고, 손끝은 책장을 넘긴다. 한국 독자에게 일본문학은 단순한 외국문학이 아니라, 일상의 감각과 닿아 있는 친숙한 풍경이다.
---
언어적 친숙성이 만드는 매끄러움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학적으로 뚜렷한 친연성을 지닌다. 둘 다 SOV(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을 따르고, 조사와 종결어미로 뉘앙스를 표현하며, 주어를 생략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렇기에 일본문학은 번역되었을 때도 매끄럽다. 예를 들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문장을 보자.
> “여름 오후, 매미 소리만이 뜰에 가득했다.”
이 한 줄은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거의 손색없이 옮겨진다. 문장의 리듬, 정서의 농도, 고요한 분위기까지 그대로 살아난다. 한국 독자는 번역투의 이질감 없이, 마치 처음부터 한국어로 쓰인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영미문학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영어는 반드시 인칭 주어를 필요로 하기에 “It is raining quietly.” 같은 문장은 한국어로 옮기면 늘 어색하다. 그러나 일본어 *“雨が静かに降っている”*는 곧장 “비가 조용히 내린다”로 이어지며, 그 매끄러움이 곧 몰입을 낳는다.

---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매혹
하지만 일본문학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유사성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닮음 속의 작은 차이가 더 큰 매혹을 만든다.
> “君のいない部屋に、夕暮れの匂いが沈んでいく。”
(네가 없는 방에, 저녁 무렵의 냄새가 가라앉아 간다.)

‘냄새가 가라앉는다’는 표현은 한국어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문학은 이런 은유를 거리낌 없이 작품의 중심부에 둔다. 한국어 독자는 이 문장을 읽으며 ‘낯설지만 아름다운’ 감각에 사로잡힌다. 익숙한 구조 + 낯선 이미지, 그 결합이 일본문학의 힘이다.
---
번역 시장과 문화적 맥락
한국 출판계에서도 일본문학은 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영어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나라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순문학부터 대중소설, 미스터리와 라이트노벨까지 폭넓게 수입되며 독자층은 더욱 다양해졌다.
이러한 지속적 번역과 공급은 일본문학을 한국 문학시장 안에서 하나의 ‘표준 외국문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과대평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과대평가라는 말의 그림자
일부 비평가들은 말한다. 일본문학은 번역의 장벽이 낮아 독자가 실제보다 더 큰 감흥을 느낀다는 것이다. 영미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번역의 어색함이 일본문학에서는 거의 사라지니, 독자는 문장의 힘을 더 크게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설령 그것이 ‘과대평가’라 하더라도, 독자가 그 안에서 익숙함과 낯섦이 동시에 빚는 떨림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문학의 본령 아닐까. 문학은 원래 언어를 넘어 감각을 흔들어 놓는 예술이므로.

---
결국 남는 것, 읽는 즐거움
일본문학을 오래 읽어온 나에게 남은 것은 단순한 지적 분석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적 친근함 속에서도 낯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의 기쁨이다.
문학이란 결국, 타인의 언어를 통해 나 자신의 감각을 비추어 보는 일이다. 일본문학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묘한 경계를 경험하게 한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거리. 그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차이의 빛이 독자를 붙잡는다.

> 익숙함의 안쪽에서 낯섦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문학이 가진 가장 순수한 기쁨을 다시금 확인한다. 그것이 일본문학이 한국에서 여전히 특별한 이유다.
'thin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구, 보수라는 안온함이 만든 느린 도시의 경제학 (0) | 2025.09.01 |
|---|---|
|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 超時空要塞マクロス (0) | 2025.07.23 |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 스크래핑 오류 (0) |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