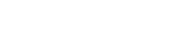🏙️ 뒤로 기댄 도시의 초상
대구를 걸으면 도시가 세월의 등받이에 편안히 기대어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유난히 더운 도시, 대구, 세월의 때가 묻은 간판들이 정겨운 미소를 띠며, 어김없는 저녁 식탁과 일찍 스러지는 불빛들이 고요한 일상을 그려낸다.
이러한 익숙함과, 안온함은 분명 미덕이다. 그러나 경제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시계바늘처럼 오직 앞만을 향해 달려간다.
차가운 수치가 증언한다. 이 도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가벼워지고 있다.
👨🎓 청춘이 떠나는 도시
더욱 뼈아픈 현실은 청년들의 발걸음에서 드러난다.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대구는 20대와 30대의 순이동에서 지속적인 유출을 겪었다. 2023년에도 청년 순이탈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 보수성의 경제적 번역
경제학에서 "보수성"은 단지 정치적 성향의 겉모습이 아니다. 위험 회피, 불확실성 기피, 새로움에 대한 경계심이 삼위일체를 이룬 현상이다.
기업 재무 연구에 따르면, 회계적 보수성이 강한 지역의 기업들은 특허 생산과 인용 빈도가 낮고, R&D 집약도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 다시 말해, 숫자마저 지나치게 신중해지면 혁신의 맥박은 느려진다.
국제 연구들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보태준다.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창업에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보수적 규범이 강할수록, 특히 도전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클수록, 소수의 모험가만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감행한다.
💰 자본이 외면하는 이유
대구의 현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 2024년 국내 벤처투자는 반등의 기색을 보였지만,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창업 생태계를 지역 전략과 시설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본의 나침반은 여전히 한 방향만을 가리킨다. "신중한 도시"의 대가를 자본이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는 셈이다.
🏭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의 딜레마
산업 구조는 더욱 명확한 그림을 보여준다. 대구의 주력 산업은 섬유, 자동차 부품, 기계, 건설이다. 이들 산업은 탄소 집약도가 높아 규제와 시장 변화의 직격탄을 맞기 쉽다.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통상 0.8~0.9톤의 CO₂가 배출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 제품에 국경에서 탄소 가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보수적 일상은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보수적 산업 구조는 곧 비용으로 돌아온다.
🔧 변화를 위한 네 가지 제언
그렇다면 대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지역 벤처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늘리되, 시장 원리로 운용하고 민간 운용사의 성과보수를 지역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연계하라. 수도권 편중을 깨뜨리는 데는 보조금보다 제도 혁신이 더 빠르다.
조달에서 '탄소·혁신 프리미엄'을 명문화하고, 공공 발주에 로컬 스타트업 가점을 확실히 부여하라. 보수적 산업 구조를 보호하려 하지 말고, 전환을 가속화하는 쪽에 위험을 배분하라.
청년의 순유출은 공공 캠페인으로 막을 수 없다. 대학·병원·연구소와 시가 공동 출자한 딥테크 시드, 의무 기숙사·보육 지원, 실패자 재도전 바우처처럼 '모험이 가능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
성공담을 "예외적인 영웅 서사"로 소비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표준"으로 재구성하라. 보수적 도시가 혁신 도시로 거듭날 때 필요한 것은 몇몇 영웅이 아니라 다수의 안전한 실패다.